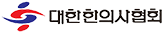|
행위별수가제, 의료서비스 항목당 지급 포괄수가제, 질병군별 미리 책정된 진료비만 지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진료보수(진료비)란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진료비 지불제도의 종류는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이 있다. ◇행위별수가제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는 실제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항목 단가 및 제공횟수만큼 진료비가 계산되는 지불제도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그 횟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진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고 의료인의 수입은 증가한다. 197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매 치료 후에 지불액을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같은 수가협상 및 상대가치점수 개편 체계 안에서는 행위별수가제 역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포괄수가제는 진료건당 지불이 이루어지며, 진단 후 지불액을 결정하면 된다.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DRG(Diagnosis Related Group·진단명기준환자군) 분류체계를 이용해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DRG는 입원환자를 자원소모 유사성과 임상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분류하는 환자분류체계다. DRG 분류는 주진단명(Major Diagnostic Category)에 따라서 외과적 시술의 유무를 판단하고, 각 외과적·내과적 방법별로 ADRG(Adjacent DRG) 분류 후 연령(필요시)이나 합병증·동반상병 분류를 첨가해서 분류한다. 적용되는 보험급여는 질병군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비용은 물론 7개 질병군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진료뿐 아니라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환자가 입원 당시 같이 앓고 있던 질병의 치료까지 포함된다. 전액본인부담은 응급진료를 위해 앰뷸런스를 이용하면서 받는 응급의료 이송처치료, 각종 수술 후 통증관리를 위한 자가통증조절법(PCA) 등이다. ◇“포괄수가제, 의료인에게 불리”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포괄수가제가 도입됐으나 의료계 안팎에선 의료인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지난 2014년 한의협이 홈페이지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 ‘건보공단과의 2013년 수가계약 시 부속합의한 내용의 폐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906명 중 1574명인 약 ‘83%’가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 폐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소요비용에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진단명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만을 받을 수 있는 탓이다. 특히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라도 의료서비스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환자들로서는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정부가 양방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전면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는 물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의약분업사태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격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다. 당시 의협은 포괄수가제 체제 아래서는 정해진 진료비로 인해 재료비, 검사료, 치료비를 낮추게 돼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에 백내장 수술이 포함되면서 2012년 6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의결할 만큼 개원가의 반발이 거셌으나 예정대로 포괄수가제는 강행됐다. 전문가들은 포괄화 지급방식의 제도가 ‘보험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실무를 담당하는 심평원의 입장에서 1회 내원 시 진료 내용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게 돼 진료 내역에 대한 심사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건보공단 또한 환자 내원에 따라 지불될 비용이 손쉽게 계산 가능해지므로 진료비 통제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행위에 따라 그에 적합한 보상을 시행하는 행위별 수가제와는 달리, 방문당 정액제는 의료인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 진료하지 못하고 제한된 의료로 결국 국가통제 하에 의존하는 지불보상체계”라고 말했다.
|